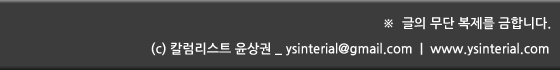새해의 문을 열다!
새해의 문을 열다!
새해 아침은 불을 껐다 다시 켜듯이 그렇게 설렘의 시작인가보다 지난밤 제야의 종소리에 묻어둔 꿈도 아직 소원을 다 말하지 못 했나 보다. 지난 시간이 외로웠다면 그 위에 희망을 내려 주시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 위에 자비의 용서를 내려 주시며. 슬펐던 날이 기억나거든 그 위에 새 미소의 흰 눈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새해 아침이 찬란한 태양 위에 빛나는 왕관처럼 새 희망 의 시작임을 알게 하소서.
어릴 적 설렘으로 일찍 일어난 새해 아침, 문을 열고 나오면 거짓말처럼 마당 가득 눈이 쌓여 있었다. 고요가 베틀로 마당 한 가득 흰 천을 짜고 있는 듯한 풍경 속을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었다. 강아지는 반들반들한 코에 눈을 묻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강아지를 따라서 서설의 평화로움을 누리며 걱정도 없이 마음의 그늘도 없이 그렇게 훌쩍 발자국 크기를 따라 자라났던 것 같다.
새해를 맞이하는 햇수만큼 나이를 먹어 가면서 “눈은 내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던 시절 위로 내리는지 모른다” “누구의 고백 같다”는 시처럼 눈에 대한 의미 성찰을 내면적으로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서 때론 삶은 고통을 수반한 긴 여행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 더불어 고통을 통해 자아의 성숙도 이루어진다는 통찰을 너무 빨리 하게 된 건 순전히 일찍부터 독립을 해야 했기 때문이지 싶다.
몸 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학창 시절 사정이 생겨 집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던 때였다. 고3이 되어 급기야는 과로와 진로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장티푸스에 걸려 조금 긴 시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은 시간들, 우연한 기회에 간호사와 마음의 고민을 봇물 터지듯 이야기하게 되었다. 어쩌면 본능적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누이처럼 대해 준 간호사의 따뜻함 때문이었지 싶다. 이야기는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정신 없이 쏟아 놓던 말문을 추스르고 이야기를 들어 주어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것 같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내가 남이간디!” 그 순간 텅 빈 내 혈관 에 가족의 피가 수혈되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씩씩해져서 퇴원할 때까지 많은 힘이 돼 주었던 간호사 누이를, 살면서 종종 생각했다.
아마도 내가 글을 쓰게 된 첫 걸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문학예술의 열정 외에 사랑의 말 빚을 갚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강은교 시인의 “너를 사랑한 다”는 시의 제목을 위해 시인은 나머지 시행들을 마음의 온기로 데워 썼다고 생각된다. 세상의 가장 피곤한 다리를 위해 그토록 의자는 추운 겨울 속에서 온몸의 온기로 기다리고 있었고 신발 속의 그림자가 주인을 위해 빛을 기다리고, 아니 담고 있다는 것. 신발들이 완성하는 길을 따라 누군가 힘차게 일어나 걸어갈 것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땐 몰랐다
그 빈 의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자의 이마가 저렇게 반들반들해진 것을 보게 의자의 다리가 저렇게 흠집 많아진 것을 보게 그땐 그걸 몰랐다 신발들이 저 길을 완성한다는 것을 저 신발의 속 가슴을 보게 거무뎅뎅한 그림자 하나 이때껏 거기 쭈그리고 앉아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그땐 몰랐다 사과의 뺨이 저렇게 빨간 것은 바람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꽃 속에 꽃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일몰의 새떼들, 일출의 목덜미를 핥고 있는 줄을 몰랐다.
꽃 밖에 꽃이 있는 줄 알았다 일출의 눈초리는 일몰의 눈초리를 흘기고 있는 줄 알았다 시계 속에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다 희망 속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다 아, 그때는 그걸 몰랐다 희망은 절망의 희망인 것을.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깻살은 한없이 통통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시간은 시계 속이 아니라 열정적인 삶 속에 있다는 걸.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살아 내지 못하고 시간에 질질 끌려온 의식의 줄을 툭 끊어 버린다. 희망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절망의 희망이”라고 주저앉아 있던 마음을 불끈 일으켜 세워 준다. 어쩌면 때론 삶이 너무 힘들어 희망 속에 희망이 있다고 미래의 꿈을 포기한 채 현실의 그늘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문 뒤에 서 가슴을 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가슴에게 시인은 말한다.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깻살은 한없이 통통하다”고. 멀리서 ‘꼬끼오’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는 것 같다. 하늘을 흔들어 여명을 부르는 그 소리에 사람들은 아득했던 의식의 세계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신이 준 아침을 연다. 영 풀리 것 같지 않았던 운명의 고리가 벗겨지듯 조여든 햇빛이 네 삶의 어두움이 것이듯. 세상 밖 먼 하늘에도 불그레한 조각해가 구름을 딛고 불쑥 솟아 오른다. 희망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운다. 임진년 새해 여러분 가정 위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